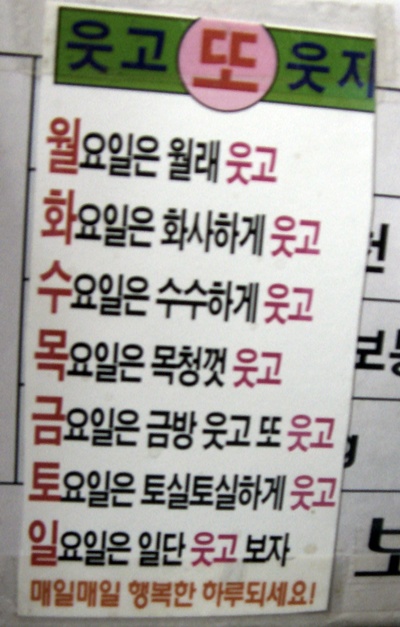녹번동에서 슈퍼 운영하는 이상준 김선자 씨 부부
|
“이러다간 슈퍼 다 없어져요.”
이상준 씨는 12년 전부터 녹번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섬유 공장을 했지만 IMF 때 정리하고 시작한 일이 슈퍼마켓이다. 경험 없는 일에 뛰어들어 좌충우돌하면서 일을 익히고 해볼 만하다 싶었을 때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이마트 생겼죠 팜스퀘어 생겼죠. 거기다 이마트슈퍼 롯데슈퍼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매상이 줄었다. SSM이 들어선 뒤로는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중심가는 임대료 비싸니까 SSM이 변두리로 들어오거든요. 이러다간 슈퍼 다 없어져요.”
요즘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다 있으니 편안하게 차 타고 가서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편안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아주 편안하게 쇼핑을 한다. 편의시설과 구색에서 밀리는 동네 슈퍼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대형마트까지 가기 뭐한 자잘한 물건들을 사러 온다. 대형마트에서는 세일이다 1플러스1이다 해서 안 해도 될 소비를 부추긴다. 과다하게 충동구매를 하면서도 동네 슈퍼가더 낫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된다.
“폐지 줍는 분들이 쓰레기 속에서 날짜 지난 걸 많이 주워요.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보세요. 충동구매해서 날짜 지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슈퍼에서 사면 하루만 지나도 와서 바꿔 달라 하면서……. 봉투도 그래요. 대형마트에서는 봉투 값 당연히 내면서 여기서 봉투 얘기하면 동네 장사하면서 뭘 그러냐 그러죠.”
새벽부터 밤까지 1년 365일
때로는 그러는 손님들이 야속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씨는 손님 발길을 붙잡기 위해 부지런히 뛴다. 새벽 2~3시면 일어나 물건을 떼러 간다. 살 게 많은 때는 가락시장까지 가기도 한다. 싱싱한 채소를 한 푼이라도 싸게 들여오기 위해서다.
“이거(고추) 팔천 원에 사 왔는데 이렇게 담아서 몇 봉지 되나? 값이 올랐는데 올랐다고 비싸게 받을 수도 없어요. 손님들은 시세변동 모르고 왜 비싸냐 하니까.”
세어 보니 열 봉지다. 하나에 천 원씩 꼭 만 원이다. 다 팔면 이천 원이 남는다.
|
“김치 담가 파니까 계속 파 다듬죠. 손님이 다 알아요. 1년 365일 파 다듬고 있다고.”
처음에는 돈을 벌건 못 벌건 장사하는 재미가 쏠쏠했지만 그것도 한 시절 장사가 안 되는 데다가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면서 웃음이 적어져 갔다.
“그래도 아저씨가 물건을 가서 사 오고 하니까 했지 외상 장사 했으면 문 닫았죠.”
|
슈퍼마켓을 물건을 공급해주는 중간 업자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채소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직접 물건을 떼러 가는 일이 있다. 많이 팔리는 물건은 금방 자리가 비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중간 공급자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직접 사러 간다. 그 편이 더 싸기도 하다.
이 씨는 손님들이 ‘백 원이라도 더 싸야’ 산다며 부지런히 발품을 판다. 두 부부가 지난 12년을 그렇게 해 왔다.
그래도 여전히 슈퍼는 동네 사랑방이다
이 씨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자수성가했다. 군 제대 후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공장을 차렸다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도전했다가 IMF로 문을 닫았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슈퍼가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 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듯하다. 기업을 일으키겠다는 젊은 시절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며 좋은 일도 많았기 때문이다.
“아줌마(부인) 있을 때는 오며가며 아는 사람들 쉼터 노릇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래요.”
말수가 적은 이 씨는 자율방범대 봉사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순찰을 돈다. 놀이터나 공원처럼 후미진 곳을 돌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시위를 한다. 잘못된 길로 들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뿌듯하다.
“여기 와서 좋았던 일은 동네 사람들 알고 지내는 거죠. 옛날 시골 인심처럼 뭐 하나 나눠 먹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동네 정보도 모여요. 누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더라 누구 딸을 여읜다더라 그런 소식이 가장 먼저 모여요. 시골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손님들이 들락거렸다. 이웃집 식당에서 물건을 가져가며 가격만 불러주고 가면 공책에 적는다. 카드 기계가 말썽을 부려 카드 계산을 할 수 없으면 잘 아는 사이니 다음에 주라 한다. 그렇게 손님을 치르고 이 씨가 묻는다.
“만 원 이상 사는 사람 봤어요?”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만 원 넘게 물건을 사 간 사람은 없다. 딱 한 명이 만 원어치를 샀을 뿐. 이 씨의 그 한마디에 동네 슈퍼의 고충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